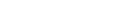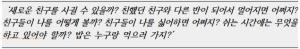제111화 부처님의 버선(佛陀布靴)
어떤 늙은 중이 농부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수시로 농부가 없는 틈에 찾아와서는 재미를 보곤 하였다.
어느 날 농부가 늦게 돌아올 줄로 알고, 둘이서 이불 속에서 열기를 뿜고 있는 데, 뜻밖에도 농부가 들어와서 문을 꽝꽝 두드렸다.
"여보, 문 열어 ! 뭣하고 있는 거야 ?"
중은 눈앞에 캄캄하여 허둥지둥 옷을 찾는 데 아무리 찾아도 버선 한 짝이 없는지라 급한 대로 한쪽 버선만 신고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여편네는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벌써부터 잤단 말야? 이봐 사내놈을 끌어들였지?"
농부는 구석구석 찾아보았으나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감기가 들었는지 추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일찍 드러누웠어요. 어서 들어와서 녹여줘요."
아내의 녹여달라는 말을 듣고 나니, 농부는 싫지 않아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엇인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어 잡아당겨 보니 낮선 버선 한 짝이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내를 족치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빈약했으므로 농부는 훗날을 위해서 몰래 감추어 두었다. 며칠 후 늙은 중이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어서 오십시요, 스님 뭐 볼일이라도 계십니까 ?"
"그것을 돌려달라고 왔네."
"그것이라뇨? 뭐 말입니까 ?"
"시치미 떼지 말게. 부처님의 버선 말이야. 자네 처가 아기를 원하기에 영험 있는 그것을 빌려준 것인 데 대엿새 되었으니까 이젠 아이가 들어섰을 게야. 어서 빨리 돌려주게나."
농부는 무거운 짐을 일시에 벗어 놓은 듯 한 심정으로 기꺼이 버선을 스님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과연 열 달이 지나자 아내는 옥동자를 낳았다.
제112화 내 무슨 한이 있겠느냐?(吾何恨焉)
전라도 순창 땅 한 선비가 슬하에 다섯 살 난 딸 하나를 두었는데 매우 총명했다.
어느 날 선비 부부가 일을 치르는데 어린 딸이 깨어나 아버지의 양물(陽物)을 보고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무안해진 선비는 꼬리라며 얼버무렸다.
며칠 뒤 마구간에서 말의 양물(陽物)이 까닥 까딱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딸이 급히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아버지 꼬리가 왜 저기 달린 거야?”
"저건 말의 꼬리지, 아버지의 꼬리가 아니다. 네 아버지 꼬리가 저 말꼬리처럼 클작시면 내 무슨 한이 있겠니?”
제113화 성씨의 유래를 듣고 놀림을 멈추다.(聞姓由止戱弄)
어떤 마을에 정(鄭)씨와 명(明)씨가 이웃하여 살고 있었다.
순박한 농민들로서 다정하기 이를 데 없어 서로 욕 친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서 명씨가 정씨에게 이렇게 놀렸다.
"여봐 ! 당나귀 나 좀 타고 가자고 다리가 아파서 죽겠어."
"이런 빌어먹을 자식 보게, 형님을 몰라보고 버릇없이 주둥아리를 놀리다니 경을 칠..."
정씨는 명씨를 마땅히 짐승으로 놀리지 못해 고작 욕설만 할뿐이었다.
"허허, 그 친구 입버릇 한 번 고약하군. 그것도 모두 고약한 성을 가졌기 때문인가? "
정씨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놀려줄 말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어느 날 정씨는 지나가는 탁발승(托鉢僧)을 만나 어찌하면 좋을지 하소연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탁발승은,
"지금 곧 명씨 집으로 앞장서시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하므로 정씨는 뛸 듯이 기뻐 탁발승을 명씨 집으로 안내하여 달려갔다.
이윽고 명씨가 정씨에게.
"이 사람 당나귀 아닌가? 그래 어쩐 일인가?"
하고 놀리므로 적당히 둘러대는 데 곧 탁발승이 들어오자 명씨는 심심하던 차에 불러들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대사님의 성은 무엇이오 ?" 하고 물었다.
"출가한 탁발승에게 속세에서 쓰던 성이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마는,
소승의 성은 말씀드리기가 심히 부끄러운 성입니다."
"아니, 무슨 성이기에 말씀하시기가 난처하다는 거요? 혹시 쌍놈의 성이라도?"
"그런 게 아니오라, 성의 내력이 좀 고약해서..." "어서 그 내력 좀 들어봅시다."
"실은 소승의 모친이 행실이 좋지 못해서 불공드린다고 절에 가서는 일정사 스님과 월정사 스님을 번갈아 가며 관계를 가졌더랍니다. 그래서 저를 낳게 되었다더군요.
그런데 어머니 자신도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일정사의 일(日)과 월정사의(月)자를 따서 한데 어울려 명(明)가라는 성을 만들어 소승의 성으로 정했다고 하더이다."
탁발승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명(明)씨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소리를 씨근거렸다.
그 후로부터 명씨는 길에서나 주막에서 정씨를 만나도 놀리지 않았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