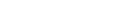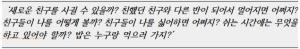- 김영일(수필가, 부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
 |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창녕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고즈넉한 전원도시이다. 대구와 창원, 밀양 등 크고 작은 도회지에 둘러싸인 도시 속의 섬으로, 여유롭게 남은여생을 보내길 원하는 은퇴자와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당찬 청장년들이 즐겨 찾는 대도시와 이웃한 농촌이다.
과거 일제는 대구와 창녕을 경유, 마산과 부산을 잇는 철로를 부설하려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지역민과 유림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양반 고을에 철길을 놓고 시커먼 연기 뿡뿡 내뿜고 굉음을 지르며 달리는 기차를 두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따라서 철도는 밀양을 지나 삼랑진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과 진주로 향하는 경전선으로 설계 변경되어 건설되었다. 그 대신 마산에서 출발해 창녕과 대구, 안동을 거쳐 원주와 춘천을 거슬러 올라 중강진까지 이어진 신작로(新作路)인 국도 5호선이 개설되었다.
일제는 조선에서 수확한 각종 농산물과 철광석, 무연탄 등 지하자원을 공출이란, 명분으로 수탈하고 만주정벌을 위해 철길을 놓고 도로를 닦았다. 그때 건설된 철도가 경인선과 경부선, 경의선이다. 또, 우마차가 다니던 좁은 길을 넓히고 교량을 설치해 신작로를 건설했다. 당시 만들어진 새 길을 우리는 국도라 부른다. 신의주에서 평양과 서울을 거쳐 목포까지 이어진 국도 1호선과 남해에서 진주, 문경, 서울과 철원을 지나 평안북도 초산까지 연결된 국도 3호선, 마산에서 시작, 대구와 안동, 원주, 춘천을 거쳐 중강진까지, 국토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국도 5호선과 부산에서 울산, 강릉, 원산, 함흥을 거슬러 온성까지 올라가는 동해안 바닷길을 국도 7호선이라 한다. 그밖에도 반도의 동과 서를 이어주는 국도 2호선(목포-부산)과 4호선(군산-경주), 6호선(인천-서울-강릉) 등 짝수 번호를 붙인 간선도로가 그때 만들어졌다.
창녕은 국도 5호선이 지나는 길목이라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사통발달 곧게 뻗은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합천과 거창 등 인근 군민들이 대구와 부산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창녕을 거쳐 가야 했다. 국도에 연결된 지방도로도 그때 함께 건설되었다. 따라서 국도와 지방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우리마을사람들은 큰 비가 내리면 어김없이 도로보수에 동원되어야 했다. 말이 좋아 신작로지, 비포장 자갈길이라 비온 뒤에는 도로 곳곳이 분화구처럼 파여 물웅덩이가 생겼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롤러코스트를 탄 것처럼 온몸이 흔들리고 멀미가 난다. 따라서 주민들을 동원해 도로보수를 한다. 일손이 부족해 부역(賦役)에 빠지는 가구는 벌금을 내야했다.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뒤로, 우리 집은 더 이상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내가 부역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파인 도로에 흙과 자갈을 채우고 다지는 일은 단순작업이지만,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책임구역은 잘 마무리했다. 간간이 빨간 줄을 굵게 두른 완행버스가 지나갈 때는 손 흔들어 인사했지만, 파란색 직행버스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올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가장자리로 비껴야했다. 대도시로 여행하는 꿈을 꾸며, 간식으로 싸온 옥수수 빵과 사이다를 꺼내먹었던 아스라한 옛 추억도 있다.
가로수는 열병식에 참가한 병사처럼 이열종대로 도열해 사시사철 멋진 모습을 연출했다. 보석같이 반짝이는 연두색 신록을 매달고 하늘하늘 춤추는 봄, 짙은 녹음으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여름, 샛노란 잎사귀를 바람에 떨구는 만추, 북풍한설에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서있는 겨울나무, 지금은 모두 사라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그때 그 버드나무 가로수 길이 그립다.
읍내로 통근하시던 젊은 아버지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다니셨던 그 길이 신작로이며, 꾹꾹 눌러 담은 양파에 짓눌려 뒤뚱거리며 기어가는 트럭 꽁무니에 매달려 국도까지 배웅했던(?) 개구쟁이 시절의 기억이 반세기가 지났어도 파노라마가 되어 스친다. 시오리 길이 멀다않고 오시던 외할머니의 길동무가 되어준 길가의 코스모스, 삶은 고구마를 머리에 이고 상기된 얼굴로 달려오던 누이동생도 그 때 그 길을 기억하겠지, 광주리 한가득 머리에 이고 장에 가시던 우리어머니는 구순이 내일 모레인데, 엊그제 일만 같다고 회상하신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다. 우리의 꿈과 애환이 깃든 추억의 신작로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했다. 자갈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기억을 지우고, 가로수는 다양한 수종으로 바뀌어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 시절을 추억케 한다. 고속도로 위를 날쌔게 달리던 우등버스는 소임을 다해 초라한 모습의 저속버스가 되어 국도를 천천히 오간다. 타고내리는 아낙네들의 왁자지껄한 수다와 웃음소리가 귓전을 맴돈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